교사 아만다(라시다 존스)와 남편 마이크(크리스 오다우드)는 검소하지만 단단한 ‘보통’의 삶을 꾸린다. 어느 날 아만다가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마이크는 신생 헬스테크 기업 리버마인드(Rivermind)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 수술은 뇌 일부를 리시버로 대체하고, 지역 기지국 신호를 통해 뇌 기능을 ‘스트리밍’해 일상을 유지하게 한다. 초기에는 수술비 무료의 저렴한 월 구독료 300달러로 기적처럼 회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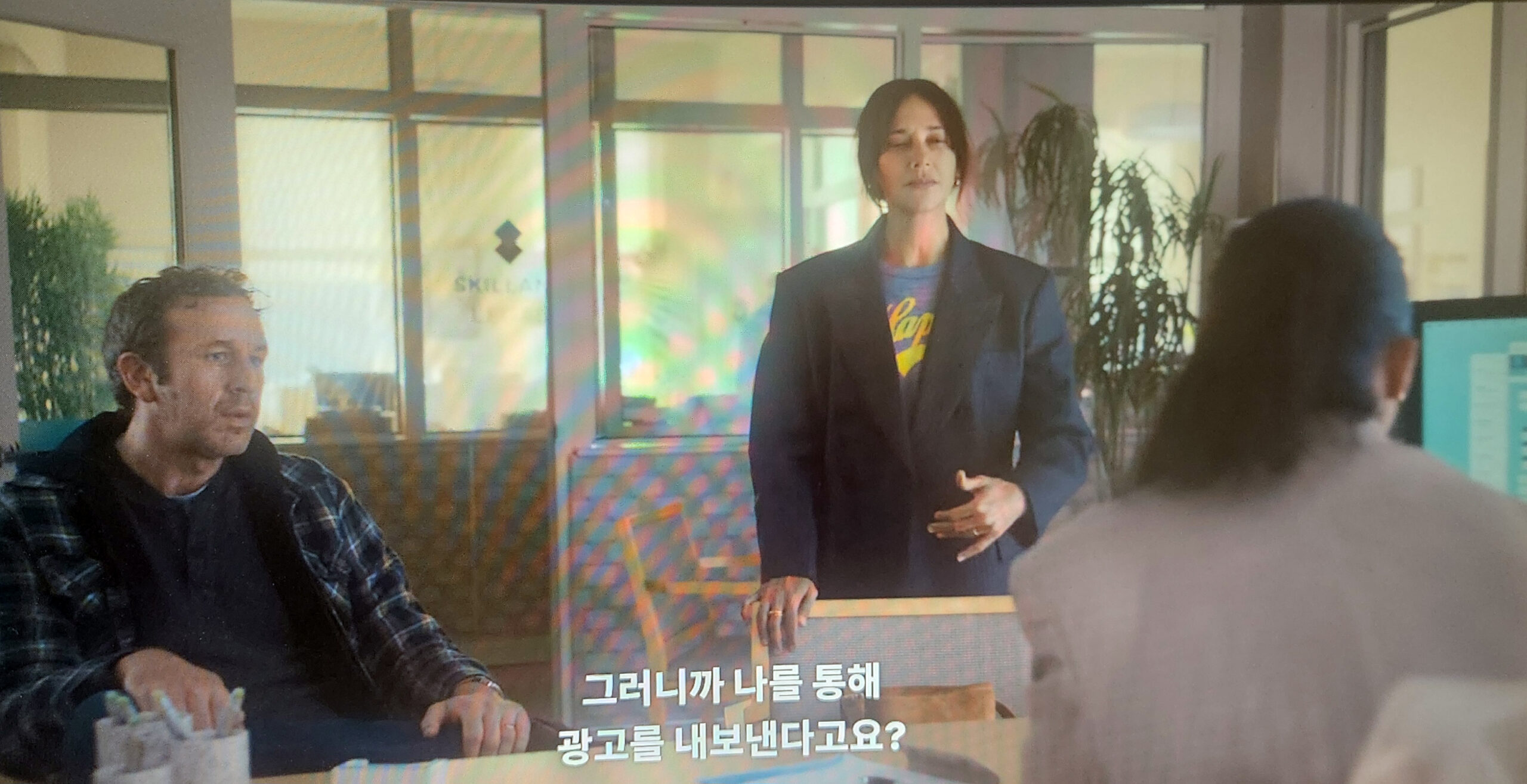
그러나 서비스가 티어(등급)로 세분화되며 가격이 오르고,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기존 요금제의 품질이 서서히 열화된다. 커버리지(기지국 범위)가 줄어 ‘데드존’이 생기고, 아만다의 뇌는 일상 도중 강제 ‘광고 모드’로 전환돼 본인 의지와 무관한 광고 멘트를 내뱉는다. 이러한 묘사는 “프리미엄 신설과 함께 기존 서비스 열화”를 지적하는 문제의식과 맞물려 있다.
구독료를 감당하려 애쓰던 마이크는 결국 극단적 콘텐츠를 올리면 돈을 주는 영상 플랫폼 ‘덤더미즈(DumDummies)’에 발을 들인다. 그럼에도 삶은 더 궁지로 몰린다. 아만다는 정신이 비어 있는 광고 모드일 때 더 이상 고통을 연명하지 않게 해 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한다. 이후 마이크가 선택한 마지막 행동은, 이 커플의 비극을 블랙미러 특유의 ‘잔혹한’ 아이러니로 마감한다.
에피소드는 2025년 4월 10일 공개된 시즌7의 첫 편(연출: 앨리 팬큐, 각본: 찰리 브루커 & 비샤 K. 알리)으로, ‘구독 없이는 생존도 허락되지 않는’ 세계를 블랙코미디로 시작해 시리즈 최상급으로 냉혹한 결말까지 미끄러지듯 도달한다.
왜 이 에피소드가 날카로운가 ?
“생존의 인프라=구독”이라는 전도(顚倒)
의료 행위를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처럼 파는 설정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의 연장선이다. 스트리밍 시장은 이미 광고형·프리미엄형 티어로 세분화되며 가격을 상향해 왔다. 블랙미러는 이 구조를 생체 인프라에 이식해 “티어 미업그레이드=신경 기능 열화”라는 잔혹한 논리를 만든다. (Deloitte의 2025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 SVOD 절반 이상이 광고형 티어 경험, 가격·광고 병행 전략 확산) 가격 인상·티어링·광고 전개는 이용자의 ‘주의력’만이 아니라 ‘자율성’ 자체를 파먹을 수 있다.
‘광고 모드’의 섬뜩함: 프라이버시를 넘어 ‘의사결정의 침탈’
광고가 화면을 차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하이재킹한다. 이건 단순 제품 PPL이 아니라 의지(agency) 박탈에 대한 알레고리다. 현실에서도 스트리밍 가격 인상과 광고 의존도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최근 연쇄 인상 사례 다수), 작품은 그 끝지점을 과감히 그린다.
선배작과의 대화
〈15 Million Merits〉가 노동의 상품화를, 〈Nosedive〉가 평판의 통화화를 전면에 놓았다면, 〈Common People〉은 생명 유지의 구독화로 한 단계 더 나간다. 〈San Junipero〉의 ‘테크가 선사하는 자비’와도 대비되는데, 이번엔 ‘테크가 강요하는 존엄의 박탈’이 중심축이다. (시즌7의 인간미가 짙다는 평가 속에서도 본편의 결말은 “가장 냉혹한 축”에 속한다.)
연기와 톤의 곡선
라시다 존스와 크리스 오다우드는 초반의 소소한 생활감에서 후반의 절벽까지 톤을 정교하게 끌어올린다. 브루커는 인터뷰와 공식 해설에서 의도적으로 ‘웃프게’ 출발해, 종국엔 잔혹한 사랑의 선택으로 수렴시키는 구조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정치경제적 풍자와 멜로드라마의 비극성을 동시에 성취한다.
아쉬움까지 포섭하는 완성도
“리시버—기지국—스트리밍”의 기술적 세계관은 최소 설명으로 전개돼 설득력의 세부가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블랙미러의 목표는 정밀 SF보다 사회적 우화에 있다. 현실의 가격 인상·티어링·광고 의존 데이터를 떠올리게 만드는 순간, 이 설정은 충분히 기능한다.
 NEOP/X
NEO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