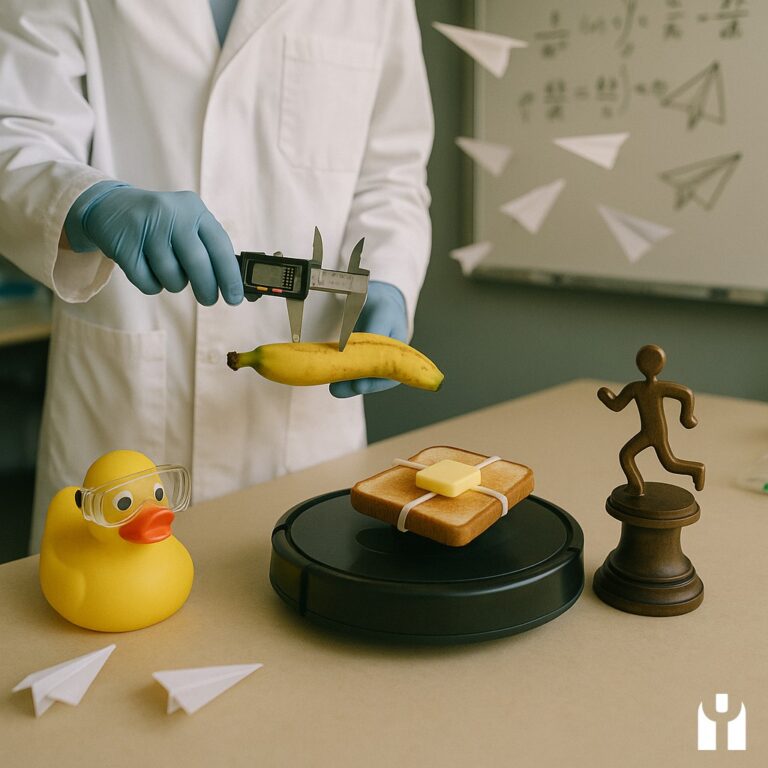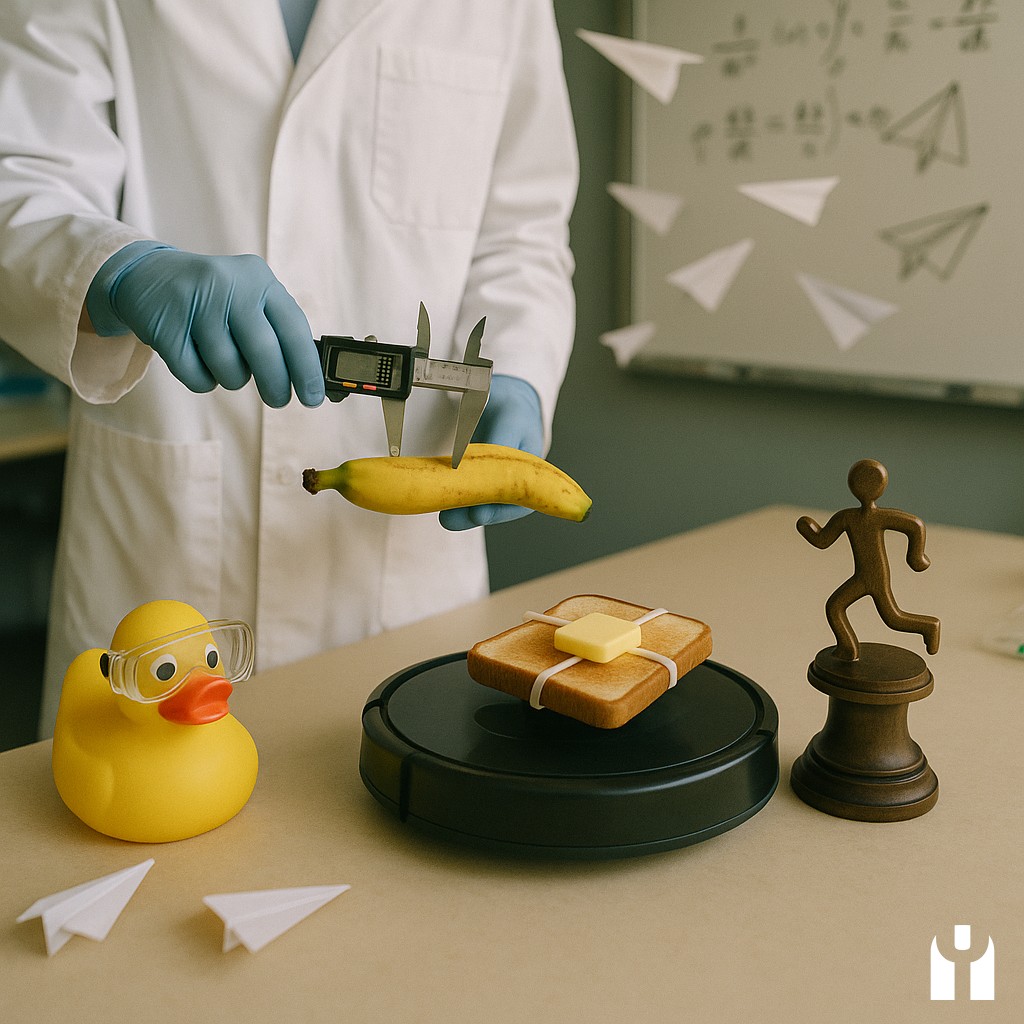
이그노벨상(Ig Nobel Prize)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곧 생각하게 하는” 연구를 시상하는 상으로, 겉보기에는 우스꽝스럽지만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실제로 흥미로운 질문이나 문제를 제시하는 연구에 수여된다. 전 세계의 과학 저널리스트, 과학자, 일반인들에게 독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그노벨(Ig Nobel)이라는 용어는 영어 단어 “ignoble”과 노벨(Nobel Prize)의 합성어로 이해된다. Ignoble은 ‘고귀하지 않은, 저속한’을 뜻하는 형용사로, 고귀한 업적을 기리는 노벨상과는 대조적인 뉘앙스를 갖는다. 즉, 겉보기에 “저속하거나 하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의미를 지닌 연구에 주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Ig”라는 축약형이 “아하”라는 감탄사처럼 발음된다는 점에서도 언어유희적인 요소가 있다.
이그노벨상은 1991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유머 과학 잡지인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의 편집장 마크 아브라함스(Marc Abrahams)에 의해 창안되었다. 처음에는 과학계의 괴짜적 연구를 희화화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차츰 과학의 대중화와 비판적 사고 장려라는 목적성이 더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과학계 행사가 되었다. 상은 매년 하버드 대학과 MIT의 과학자들,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들에 의해 수여되며, 주요 수상자는 직접 행사에 참석해 연구를 설명한다.
이그노벨상 행사에는 유쾌하고 기발한 연출이 곁들여진다. 수상자 발표 시에는 8세 소녀가 시간을 초과하면 “지루해요!”라고 외치며 발표를 끊고, 청중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축하를 한다. 대표적인 일화로 2006년에는 멸치를 요리할 때 전자기장을 쓰면 더 맛있다는 연구나, 2001년 심술궂은 아이가 왜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일본 연구자들이 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일화는 과학의 지적 유희성과 창의성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유도한다.
최근의 이그노벨 수상 사례로는 2022년 동물들의 배설 후 방향 전환 행동에 대한 연구, 또는 고통의 순위를 매긴 곤충에 물렸을 때의 주관적 통증 경험에 대한 연구가 있다(Abrams et al., 2022). 또한 학술적으로도 이그노벨 수상 주제는 실제로 이후 주요 학술지에 인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Gallup, A. C. 등(2011)의 하품의 전염성과 사회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이그노벨 수상 이후 지속적인 학술적 인정을 받았다. 이처럼 이그노벨 수상 연구는 단순한 기괴한 관심사에 그치지 않고, 과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한다.
APA 참고 문헌:
Gallup, A. C., Miller, M. L., & Clark, A. B. (2011). Yawning and sociality: Yawning as a possible social cue. Physiology & Behavior, 102(4), 357–360. https://doi.org/10.1016/j.physbeh.2010.11.036
Abrams, M., Timm, A., Watanabe, N., & Nakahira, T. (2022). Obsessive magnetic field alignment in dung beetles and its navigational significance. Proceedings of the Ig Nobel Prize Ceremony, 2022.
이그노벨상은 대중에게 과학에 대한 재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익한 도구이며, 실제 연구세계에도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생활의 사소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혁신적 기술 개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며, 인간 행위나 생태계의 미시적 측면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 기초자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테플론 코팅의 접착성이 사소한 실험에서 출발했듯, 바나나 껍질에서의 마찰력 분석이나 개 짖는 소리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인간-환경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볼 때, 이그노벨상은 전통적 학술 체계가 종종 간과하는 창의성과 호기심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과학이 반드시 거창하거나 정형화된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간 정신의 본연적 탐색 본능과 놀이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는 과학윤리 및 철학적 논의에도 일조할 수 있다. 과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화적 코드와 접목됨으로써 더욱 풍부해질 수 있으며, 이그노벨은 그러한 다층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실험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학 교육, 정책, 연구 기획에 있어 이그노벨상 수상의 사례들은 단지 희화적인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과학 대중화, 혁신 장려, 연구 윤리관 정립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모델로 기능하며, 장차 연구자들이 더욱 넓은 사고행위와 실험정신을 지닌 탐구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문화적, 지적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다.